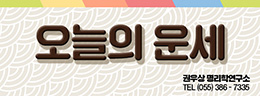어느 동물원에서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를 주었더니 원숭이는 고개를 흔들며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지었다. 다시 사육사가 아침은 4개, 저녁을 3개 주었더니 만족하여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살펴보면 원숭이의 하루 먹이는 모두 7개지만 아침 몫이 3개와 4개인 차이에 원숭이는 고개를 흔들었던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선재되어야 한다는 욕심에 부딪히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수학을 기피하는 많은 사람들도 수에 대한 집념은 대단하다. 물건을 살 때도 돈의 효용과 물건의 개수를 비교하여 그 가치를 캐어내고자 한다. 어느 누구도 돈의 가치에 떨어지도록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다. 수(數)에 대한 이해를 넓히어야 하고 공부도 하여야 할 것이다. 수학은 인간생활의 가치를 설정하는데 가장 요긴한 법칙이다. 또한 불교를 신앙하고 불교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수학의 수업은 필요한 요건이다. 다른 종교도 수리적 이해나 논리적 이해방식이 시도 되고 있지만 특히 불교의 용어는 대다수가 수적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삼보(三寶), 삼법인(三法印), 사성제(四聖啼), 사생(四生), 사고(四苦), 오근(五根), 오력(五力), 육바라밀(六波羅密), 육도(六道), 칠각지(七覺支), 칠처(七處), 팔정도(八正道), 팔바라이(八波羅夷)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수(法數)가 있다. 오늘날 수학에서의 무한(無限)의 의미는 유한(有限) 보다 더 본질적이며 심층 세계의 그 무엇으로 해석하려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유한을 무한의 부분으로서 해석하고 있으나 고대 그리스 사람은 무한을 아페이론(不定)으로 단장하였고, 또한 무의미한 것으로 보았다. 즉 그것은 본질적인 유한을 부정하는 <유한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보았고 유한 그것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론을 제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처럼 그리스 사람들에 의한 소박한 무한 개념에 비하여 불교의 무한관(無限觀)에는 깊은 통찰력과 우주를 무한으로 보는 슬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공(空)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무(無)와 대립하는 무한의 과제가 항상 중요한 문제로 파악된다. 특히 정토사상에서는 무한이 의미하는 것, 즉 무한력의 포용성을 내세워 유한세계 즉 인간세계가 향유하는 유한성의 공허를 강조함은 물론 공(空)의 실체를 드러내어 유한성에 함몰하는 편견을 치유하려 하였다. 오늘에 와서 자연수계의 구조를 보면 전체와 그 일부분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동등한 세계를 존립시킴을 알 수 있다. <칸토르>는 이와같이 무한 개수의 무한 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수계 보다 훨씬 큰 무한이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무한개념이란 지극히 비현실적인 것이므로 이를 믿게 하려는 노력은 헛수고에 그치는 수가 많아도 <칸토르>는 굴복하지 않고 무한의 의의를 체계화 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정신병원에서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무한 개념을 해석하려는 집념을 갖고 있어서 위대한 혁명이요, 창조적 결과였다. 불교에서도 인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일한 존재임을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시(時), 공(空)의 유한적인 인간을 무한세계로 끌고 가는 수레는 자비(慈悲)이다. 구원으로 표상되는 자비는 현재 수학의 논리와도 비견할 만큼 무한 세계를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생길 때 미세한 세계가 큰 세계가 되고 또한 큰 세계도 미세한 세계와 다(多)의 세계가 되고 다(多)의 세계는 작은 세계다. 광대무변한 세계와 미소한 세계의 차이는 없다. 붓다의 일모공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고 일체의 세계를 보는 것이 바로 붓다의 일모공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무한관을 시간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한 찰나에 무한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구사론에서 설파하였다. 불교에서 공(空)이라고 하면 허공 즉 없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공(空)은 허무, 허공과 같은 의미가 있다. 공이란 것은 실재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원어 반야심경에 ‘照見五蘊皆空(조견오온개공)’이란 구절이 있다. ‘오온이 공함을 밝혀 보아’라는 뜻이다. 오온(五蘊)이란 의식을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색(色 : rupa). 수(受 : vedama). 상(想 : samjna), 행(行 : samakara), 식(識 : vijnano)을 말한다. 오온(五蘊)이란 존재도 가상적인 환(幻)이란 것이다. |